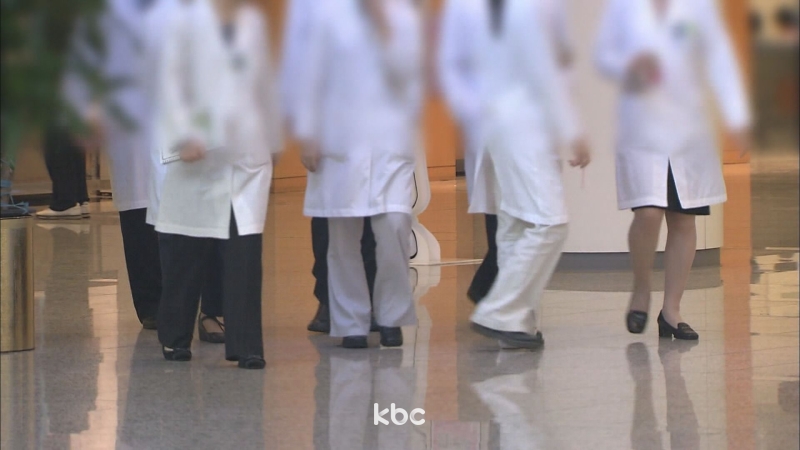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기대수명이 13년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기대수명은 90.11세에 이르지만, 경북 영덕군은 77.12세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수명 격차'는 의료 인프라의 극심한 지역 편중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의사와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고, 이는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수도권이 211.5명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169.1명에 불과합니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역시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있고, 의료인력의 연평균 증가율마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에 거주하는 중증 환자들은 KTX를 타고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의료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던 공중보건의사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복무 환경으로 인해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202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천 명 선이 무너졌고, 2025년에는 1천 명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은 가뜩이나 위태롭던 지역 의료에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더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의 65.6%가 수도권 병원 소속으로, 비수도권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2024년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는 단 1명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병상수급 관리 계획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장의 인력 유출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원 재분배를 넘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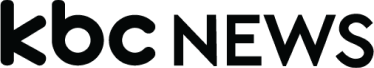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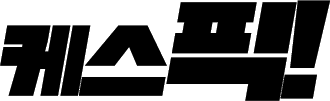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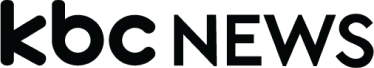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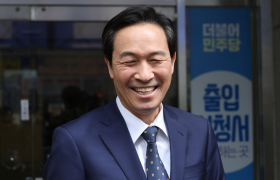




































댓글
(0)